|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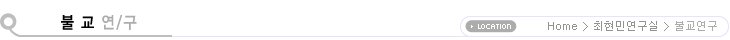
|
| 간화선 수행 |

 |
|
|
WRITER:
 관리자 (1.♡.172.206) DATE :
14-01-24 10:35 READ :
1554 관리자 (1.♡.172.206) DATE :
14-01-24 10:35 READ :
1554
|
|
 간화선 수행.pdf (474.0K), Down : 22, 2014-01-24 10:35:18 간화선 수행.pdf (474.0K), Down : 22, 2014-01-24 10:35:18 | |
간화선 수행
(본고는 운주사에서 출간된 <불교와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만나다, 최현민 저> 제8강 ‘수행의 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①화두의 의미와 간화선의 3요체
간화선看話禪의 ‘간看’은 꿰뚫어본다는 뜻이며 ‘화話’는 화두話頭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화선이란 화두참구를 통해 단박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두는 다른 말로 공안公案이라고도 하는데 공안은 본래 관공서의 공문서, 법칙의 조문을 의미합니다. 공문서에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없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대성을 지니고 있듯이 공안도 깨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는 화두란 지성이나 이성, 곧 분별지分別智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화두참구에는 어떤 분별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화두를 든다는 것은 대상세계와 접촉하는 6근(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경계를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6근이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화두에 집중함으로써 더 이상 미혹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래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는 선요禪要에서 화두를 공부할 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선정에 세 요체가 있다. 첫째는 크게 믿는 마음(大信根,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니, 이 일은 수미산을 의지한 것과 같이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크게 분한 생각(大憤志)이 있어야 하니, 마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면 당장 덤벼들어 한칼에 결단내야 하듯 크게 분해하는 의지이다. 셋째는 커다란 의심인 대의정大疑情이 있어야 되니, 마치 어두운 곳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곧 드러내고자 하나 드러나지 않은 때와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세 요소를 갖추면 공부는 바로 성취된다.
그 첫째가 대신심大信心입니다. 강한 믿음이 없다면 수행하다가 도중하차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수미산 같은 흔들림 없는 큰 믿음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각기 차이가 있어도 일체 중생이 불성에 있어서 다르지 않음을 신앙하는 겁니다.
둘째로 대분심大憤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성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과거의 조사들은 모두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대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음에 대해 분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분심大憤心을 일으켜 더욱 분발하여 자신도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스스로 촉구하는 겁니다.
셋째는 대의심大疑心입니다. 이는 간화선에만 있는 독특한 수행 원리로, 화두를 끊임없이 의심함으로써 망념妄念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의 화두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천만 가지 사고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의심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과정을 내포하는 일반적인 의심과는 달리, 논리적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화두를 간절히 의심하는 것인데, 그렇게 의심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심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의정疑情이라 합니다. 의정을 일으키는 것이 간화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정이 깊어지면 자신이 의심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의단疑團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의단大疑團이란 자신이 화두와 하나가 되어 서로 나누어지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②화두참구와 깨침
화두참구에는 활구참구活句參究와 사구참구死句參究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활구참구는 선지식으로부터 공안을 받아 이를 끊임없이 참구해가는 것인 반면, 사구참구는 문자선처럼 죽어 있는 글귀를 이론적으로 분석․종합․비교․적용해 보는 참구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간화선에서는 사구참구가 아닌 활구참구를 통해 가장 빠른 경절문徑截門으로 들어감을 목표로 삼습니다. 화두참구를 할 때 일생 동안 ‘하나의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화두를 타파한 후 스승으로부터 또 다른 화두를 받아 타파하는 단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선종에서는 주로 전자의 방법을 쓰지만 일본 선종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화두참구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후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정통 쪽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화두라 할 수 있는 ‘이뭣꼬’란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으로 우리 존재의 실상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깨달음을 추구하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물음을 던짐으로써 화두를 참구합니다. ‘무無’자 화두는 조주趙州 스님의 제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무無”라고 답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라 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가?”를 계속 참구해가는 것이지요.
화두참구를 할 때는 끊어짐 없이 화두와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끊어짐이 있다는 것은 화두를 놓쳤다는 것이고 망상분별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활구참구는 하나의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계속 참구한다는 점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계속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관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혜大慧는 서장書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차 마시거나 밥 먹는 동안, 기쁠 때나 노여울 때, 벗과 대화를 나눌 때, 처자식들과 모여 있을 때,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워 있을 때, 경계와 접촉하고 대상과 마주치며 좋은 느낌이나 불쾌한 느낌을 받을 때, 혼자 어두운 방에 있을 때 등 어느 경우나 잠시도 빈틈이나 끊어짐이 있어선 안 됩니다. 다만 하루 어느 시각, 어떤 행위 방식에서건 ‘항상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는 화두를 놓치지 말고 들며 어느 때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두를 공부할 때 고요한 장소에서 화두를 들고 간절히 의심해 들어가는 것을 ‘정중靜中공부’라 합니다. 그러나 화두를 든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사無事의 경계에 자신을 폐쇄해놓고 번잡한 일상과 단절되어 수행함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하는 ‘동중動中공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정중공부와 동중공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정疑情과 의단疑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혜 선사는 “가고 머물며 앉고 눕는(行住坐臥) 일상에서 화두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이상에서 간화선의 화두참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럼 역대 선사들은 어떻게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갔는지 살펴봅시다. 서산대사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마조도일은 남악회양南岳懷讓의 “집착이 없고 취하고 버릴 것 없는 것이 선이다”라는 말에 깨쳤다고 합니다. 또한 백장회해百丈懷海는 마조의 “할” 소리에, 동산양개洞山良价는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임제臨濟는 황벽黃檗의 몽둥이세례만 받다가 대우 스님이 “허, 황벽이 그처럼 자네를 위해 애썼는데 허물을 찾고 있단 말인가?”라는 말에 깨쳤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다기보다 일상에서 일어나며 또 ‘단박에 깨침이 이루어짐(頓悟)’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화두참구를 통해 의단疑團 상태에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깨달음이란 일상에서 체험되지 않는 황홀경(엑스타시)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깨달음은 어떤 인식차원에서의 초탈을 통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하나의 체험으로 보고 수행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수행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일상 속에, 수행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떠나고, 수행을 떠나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이 깨달음의 세계에 있어도 거기가 얻고자 하는 깨달음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이렇듯 수행과 깨침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칫 간화선에서처럼 깨달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수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묵조선黙照禪은 수행의 자리를 깨달음의 자리로 보는 수증일여修證一如로서의 수행을 강조하면서 간화선과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
|
|
|
|



